필리오퀘 문제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필리오퀘 문제는 '그리고 아들'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 '필리오퀘'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추가되면서 발생한 동서 기독교 교회의 신학적 논쟁이다. 이 문제는 성령의 기원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동방 정교회는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발원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방 교회는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서 발원한다고 주장한다. 필리오퀘는 9세기부터 동서 교회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1054년 동서 교회의 분열, 즉 '대분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 가톨릭 교회는 필리오퀘 교리를 유지하며, 성공회와 개신교는 헬라어 원문 니케아 신경을 따르거나, 필리오퀘를 생략한 신경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언어적, 신학적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간의 대화를 통해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6세기 기독교 - 베네딕도 규칙서
베네딕도 규칙서는 6세기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제시한 수도 생활 지침 문서로, 수도 공동체 생활의 규범과 영적 원칙을 담아 기도, 노동, 독서, 순종, 겸손 등을 강조하며 서방 수도 생활의 토대가 되어 중세 유럽 사회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현재까지도 베네딕도회 수도자들의 삶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세속적인 작업 환경에도 적용 논의가 이루어진다. - 6세기 문서 - 베네딕도 규칙서
베네딕도 규칙서는 6세기 누르시아의 베네딕토가 제시한 수도 생활 지침 문서로, 수도 공동체 생활의 규범과 영적 원칙을 담아 기도, 노동, 독서, 순종, 겸손 등을 강조하며 서방 수도 생활의 토대가 되어 중세 유럽 사회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현재까지도 베네딕도회 수도자들의 삶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세속적인 작업 환경에도 적용 논의가 이루어진다. - 11세기 기독교 - 제1차 십자군
11세기 후반 서유럽 기독교 세계가 셀주크 투르크의 팽창과 성지 예루살렘의 위기에 대응하여 일으킨 종교적 군사 원정인 제1차 십자군은,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호소로 시작되어 예루살렘 점령과 십자군 국가 건설로 이어졌으나, 잔혹 행위와 갈등 또한 야기했다. - 11세기 기독교 - 프로스로기온
프로스로기온은 안셀무스가 "그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신을 정의하고 존재론적 논증을 제시하며, 믿음과 이성의 관계 및 신의 본질과 속성을 탐구하는 철학적 논문이다.
| 필리오퀘 문제 | |
|---|---|
| 개요 | |
| 명칭 | 필리오케 |
| 라틴어 표기 | Filioque |
| 그리스어 표기 | τὸ ἐκ τοῦ Πατρός (καὶ τοῦ Υἱοῦ) ἐκπορευόμενον |
| 의미 | 그리고 아들로부터 |
| 관련 교리 | 삼위일체 |
| 역사 | |
| 기원 | 서방 교회 |
| 최초 사용 시기 | 589년 제3차 톨레도 공의회 (현지 교회) |
| 보편 교회 채택 | 11세기 |
| 신학적 논쟁 | |
| 주요 쟁점 | 성령의 발원 |
| 동방 교회 입장 |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발원함 |
| 서방 교회 입장 |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원함 |
| 교파별 입장 | |
| 로마 가톨릭교회 |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정당한 발전으로 간주 |
| 동방 정교회 | 이단적인 추가로 간주하며 수용 불가 |
| 개신교 | 대체로 수용하지만, 중요성을 달리 봄 |
| 성공회 | 지역에 따라 수용 여부 다름 |
| 관련 문서 |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46항 ~ 248항 |
| 발라몬 선언 | (1993년) 가톨릭과 정교회의 공동 성명 |
2. 역사
필리오퀘(Filioque) 논란은 용어 자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교리의 정통성,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해당 용어를 삽입하는 것의 정당성,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 대한 네 가지 이견을 포함한다.
앤서니 시엔스키는 "궁극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성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성, 교회의 가르치는 권위, 그리고 지도자들 간의 권력 분배였다"고 썼다.[1]
휴버트 컨리프-존스는 필리오퀘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동방 정교회 견해, 즉 "자유주의적" 견해와 "엄격주의적" 견해를 제시했다. "자유주의적" 견해는 논란을 상호 오해의 문제로 보며, 동서 양측 모두 서로 다른 신학을 허용하지 못했다고 본다. 반면 "엄격주의적" 견해는 포티우스, 에페소스의 마르크 등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필리오퀘 문제가 교리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시엔스키는 20세기에 필리오퀘를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사이의 권력 투쟁의 무기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신학적 문제가 교회론적 관심사를 훨씬 능가했다고 언급한다. 동방과 서방 기독교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서로 다르고 궁극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가르침"을 발전시켰는지 여부가 핵심 질문이었다.[2]
서방에서는 동방의 필리오퀘 거부를 아리우스주의의 일종으로 보았고, 동방에서는 필리오퀘 삽입을 서방이 "실질적으로 다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징후로 보았다. 시엔스키는 권력과 권위가 논쟁의 핵심 문제였던 만큼, 상대방이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했다는 믿음에 감정이 격앙되었다고 주장한다.[2]
요한복음 20:22[3]과 같은 성경 구절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 등 교부들에 의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둘 다로부터 본질적으로 유출된다"고 말하는 근거로 여겨졌다.[4] 갈라디아서 4:6,[5] 로마서 8:9,[6] 빌립보서 1:19[7] 등에서 성령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등으로 불리며, 요한복음의 구절들[8]과 요한복음 16:7[9]도 인용되었다. 요한계시록 22:1[10]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로부터 유출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공회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필리오퀘''를 생략하도록 권고했다.[42] 미국 성공회는 공동 기도서 개정 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필리오퀘''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44] 스코틀랜드 성공회는 현대 언어 전례에서 ''필리오퀘'' 조항을 더 이상 인쇄하지 않는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동지중해 연안에서는 그리스어, 서지중해 연안에서는 라틴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으며, 공의회(정교회에서는 전세계 공의회라고 한다)에서 채택된 신조도 그리스어를 원문으로 한다. 로마 교회를 비롯한 라틴어 지역에서는 성경이나 신조를 라틴어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그리스어 원문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ἐκ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υόμενονgkm)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9세기에 가톨릭 교회 측은 라틴어 번역에서 "아버지로부터 (ex Patregkm)" 뒤, "나오셨다 (proceditla)" 앞에 '''"그리고 아들 (로부터) (Filioquela)"'''를 덧붙여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ex Patre Filioque proceditla)로 하고, 이를 정본이라고 주장하여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측이 반발했다.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포티오스 1세와 전 총대주교였던 이그나티오스를 둘러싼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내부의 정치적 싸움에 로마 교황이 개입하여 이그나티오스를 지지했다. 이로써 동서 기독교회를 양분하는 심각한 대립 상태가 초래되었다.
이그나티오스는 정치적으로 승리하여 로마 교회와의 관계 개선을 꾀했고, 동로마 제국 황제 바실리오스 1세는 포티오스를 파면하고 추방했다. 이 대립은 포티오스가 생존해 있는 동안 종결되었고, 포티오스는 명예 회복하여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로 복귀했다.
그러나 동서 교회의 분열은 조정되었지만,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의 정당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 등 균열이 남았다. "필리오퀘"를 둘러싼 동서 교회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1054년의 대분열을 낳았다.
조디스 헤린은 서방 교회에서 "필리오퀘" 조항이 추가된 경위에 대해 7세기 경 히스파니아에서 "필리오퀘"라는 어구가 덧붙여졌고, 로마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1세기에 로마 교황이 이 구절을 정식으로 채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1438년 피렌체 공의회에서 그리스 계통 주교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하여"를 승인했지만, 러시아 정교회는 결의 승인을 철회했다. 로마 교회에서는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Filioque"를 더한 라틴어 신조가 다시 승인되었다.
현재도 정교회에서는 "성령은 아버지로부터만 발출되어, 아들을 통하여 파견된다"라고 한다.
2. 1. 역사적 전개
589년 제3차 톨레도 시노드에서 서방교회가 라틴어로 번역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하 '니케아 신경'이라 함)에 아리우스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필리오퀘'를 처음으로 첨가하였다.[83] 이는 코이네 그리스어가 신학 표준 언어였던 상황에서 라틴어 번역의 문제였고, 니케아 신경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았던 문제이며, 신학적 문제이기도 했다.코이네 그리스어, 헬라어 니케아 신경 원문의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發)하시고'''(토 에크 투 파트로스 에크포류오메논[83], τό εκ τού Πατρός εκπορευόμενον)"라는 구절은 라틴어 번역본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퀴 엑스 파트레 필리오퀘 프로체디트[84], qui ex Patre '''Filióque''' procédit)"로 바뀌었다.[84] 이로써 동방 교회의 그리스어 니케아 신경과 서방 교회의 라틴어 니케아 신경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필리오퀘가 삽입된 니케아 신경은 스페인 내에서만 사용되었다.
796년 프리울리 시노드에서 프랑크 왕국 아킬레이아의 파울리노 총대주교는 필리오퀘의 니케아 신경 삽입을 옹호하였고, 800년경에는 프랑크 왕국 전체 미사에서 필리오퀘가 삽입된 니케아 신경이 암송되기 시작했다. 847년 프랑크 왕국의 수도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 소개되자 동방교회 수도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레오 3세는 809년 필리오퀘 추가를 막고자, 필리오퀘가 없는 형태의 니케아 신경을 코이네 그리스어 원문과 라틴어 번역문으로 작성하여 성 베드로 묘에 봉헌된 은제 탁자 2개에 새겨넣도록 하였다. 그러나 베네딕토 8세는 1013년 필리오퀘가 삽입된 라틴어 니케아 신경을 다시 거론하여 승인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포티우스 시대 이후, 필리오퀘는 교황 수위권(首位權) 논쟁 등 여타 신학적 문제와 더불어 동·서방 교회 갈등의 한 요인이 되었다.
2. 2. 역사적 의미
필리오퀘 문제는 서방교회,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중심의 공교회(보편교회) 치리에서 벗어나 자립하고 교황 권위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1세기 로마 교회는 이미 9세기 초 레오 3세에 의해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려진 필리오퀘 문구를 다시 꺼내들었는데, 이는 로마 교회의 자립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85]로마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베드로와 자신들의 역사적 연관성을 주장했다. 이는 다른 지역 교회에는 없는 로마 교회만의 특징이었다.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성령이 발한다는 필리오퀘의 핵심은 로마 교회의 총대주교를 교황으로 만들고, 로마 교회를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와 분리하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교리였다.[86]
로마 교회의 신학적 설계에 따르면, 필리오퀘라는 한 단어 덕분에 성자에게서 직접 수위권을 받은 베드로를 잇는 로마 총대주교만이 성자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이끄심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86] 따라서 다른 총대주교들보다 우위에 서게 되며, 이 우위성을 지닌 로마 총대주교는 교황이 되고, 교황이 이끄는 로마 교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의 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교리가 형성되던 11세기와 12세기에도 로마 교회 내부에서 교황의 우위 주장에 대한 반대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87]
결국 필리오퀘 교리는 로마 교회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치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자립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고, 교회 대분열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 동·서방 교회의 상호 파문과 그 무효화
교황 레오 9세 재위 기간, 교황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미카엘 케룰라리오스가 그의 관할 지역에서 라틴 전례 관습을 금지한 것을 계기로 특사 훔베르트 추기경을 파견하였다. 교황은 훔베르트 추기경을 통해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에게 '세계 총대주교' 칭호 폐기와 필리오퀘가 들어간 신경의 공식 채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타협하지 못했고, 결국 총대주교는 교황 특사인 추기경을, 특사는 총대주교를 서로 파문하였다(1054년).
하지만 서방교회 측의 파문은 특사 파견자인 교황 레오 9세가 이미 사망한 이후였기 때문에 합법성에 문제가 있었다. 동방교회 측의 파문 역시 교황이나 서방교회 전체가 아닌 특사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것이었으므로, 교회법상 동·서방 교회가 서로를 파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또한 1965년 교황 바오로 6세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 1세는 1054년의 상호 파문을 무효화하고 화해의 인사를 나누었다.[1]
4. 신학적 합의의 시도와 좌절
1274년 리용 공의회와 1439년 피렌체 공의회에서 동·서방 교회 재결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동방교회 측은 필리오퀘 신경 삽입은 거절했지만, 그 교리 자체는 승인하는 입장을 보였다.[11][12][13] 이를 통해 신학적 논쟁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1472년 동방교회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하여 리옹과 피렌체에서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동·서방 교회는 완전히 분열되었다.
5. 동·서방 교회 양측의 입장
삼위일체의 위격들 간의 관계에서 한 위격은 유출을 통해서만 다른 위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된다.[3] 요한복음 20:22[3]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를 포함한 교부들에 의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둘 다로부터 본질적으로 유출된다"고 말하는 근거로 여겨졌다.[4] 갈라디아서 4:6,[5] 로마서 8:9,[6] 필립비서 1:19[7]에서는 성령을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며, 요한 복음에서 예수에 의해 성령이 보내지는 구절들[8]과 요한복음 16:7[9]이 인용된다. 요한계시록 22:1[10]은 천국의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로부터 유출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에첸스키(Siecienski)는 신약 성경이 성령의 유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나중에 삼위일체 신학을 형성한 신약 성경에 확립된 특정 원리들과 라틴인과 그리스인 모두가 Filioquela(필리오케)와 관련하여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한 특정 구절들이 있다"고 말한다.[3]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발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많은 인용구"를 제공하며, 그리스어 동사 προϊέναιgrc(라틴어 procederela와 유사)와 προχεῖσθαιgrc(~로부터 흘러나오다)를 사용했다.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 밖으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둘 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본질로부터 오신다는 일련의 표현"을 제시했다.
카파도키아 교부들과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을 포함한 그리스 교부들은 성령이 아들로부터 발현한다는 후대의 신학에 대해 명시적 지지 또는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역사적으로 양측에서 제기되었지만, 인용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한쪽 신학을 지지하는 데 사용된 중요한 원칙들을 천명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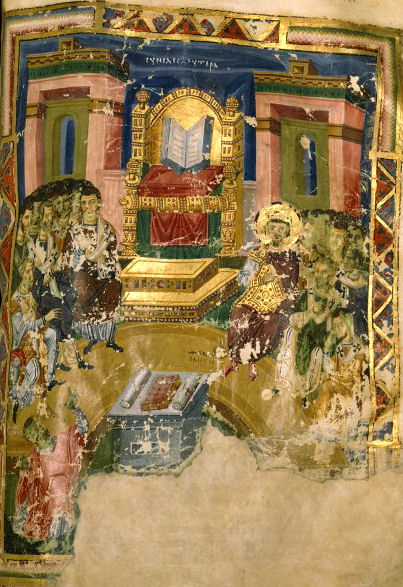
니케아 신경은 제1차 세계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그리스어로 작성되었으며,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문장으로 끝맺었다. 성령의 발현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정의되었는데, 이 신경은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칼케돈 공의회(451년)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았다.[28] 학자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이 신경은 니케아 신경의 확장본이 아니라 별개의 전통적인 신조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니케아 신경에 성령, 교회, 세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 신경은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오신다"고 고백하며, 이는 요한복음 15:26에 근거한다.[21]
그리스어 ἐκπορευόμενονgrc()은 발현의 궁극적인 근원을 가리키지만, 라틴어 procederela는 매개 채널을 통한 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서방 교회는 더 일반적인 라틴어 procederela를 사용했고, 더 구체적인 그리스어 ἐκπορεύεσθαιgrc(, "기원에서 나오다")는 사용하지 않았다.
에페소스 공의회는 325년 신경을 인용했지만, 381년 신경은 인용하지 않았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Filioquela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에페소스 1차 공의회 제7조(니케아 신조 추가 반대)를 근거로 한다. 서방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Deum de Deola)과 "그리고 아들" (Filioquela)을 추가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325년 니케아 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모두 낭독되었다.
4세기 초,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는 ἐκπορεύεσθαιgrc와 προϊέναιgrc를 구별하여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지만(προϊέναιgrc) 출생이 아니라 발출(ἐκπορεύεσθαιgrc)에 의해서이다"라고 기록했다. 5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은 성령이 procederela 및 προϊέναιgrc의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한다고 가르쳤다. 아타나시우스 신경과[27] 교황 레오 1세의 교리 서한은 446년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된다고 선언했다.[28] 동방 교부들은 서방의 가르침을 알았지만, 일반적으로 이단으로 간주하지 않았다.[26] 447년 레오 1세는 이를 가르쳤고, 반-프리스킬리아누스주의 공의회에서도 선포되었다.[28]
Filioquela는 톨레도 제3차 공의회 (589)에서 아리우스파에 반대하여 신경에 삽입되었고, 레카레드 1세 왕과 서고트 왕국의 일부 아리우스파가 정통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톨레도 제11차 시노드(675)는 교리를 포함했지만 용어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톨레도 시노드들은 Filioquela 조항을 확인했고, 프랑크 왕국과 잉글랜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1014년까지 신경에서 전례적으로 선포되지 않았다.
교황 다마소 1세,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교황 레오 1세 등 4, 5세기 라틴 교회 교부들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한다고 명시했다. 리옹의 에케리우스, 마실리아의 겐나디우스, 보에티우스, 라벤나의 아그넬루스 주교, 카시오도루스, 투르의 그레고리우스는 성령이 아들로부터 발출된다는 생각이 서방 교회 신앙의 일부로 확립되었다는 증인이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일반적으로 성령이 아들로부터 발출된다고 가르쳤다.
교부들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라는 구절도 사용했으며,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는 두 표현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두 구절 모두를 받아들인다.[29]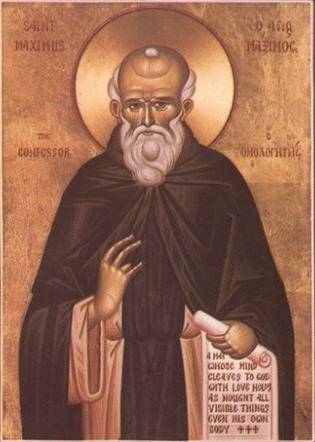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파울 2세 총대주교는 "필리오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교황 테오도로 1세 또는 교황 마르티노 1세를 비난했고, 테오도로 1세는 단의설 때문에 647년에 파울 2세를 파문했다. 막시무스 콘페서는 로마인들이 "그리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
8세기 말, 프랑크 왕국 교회 지도자들은 필리오퀘 조항이 원래 신조의 일부라는 개념을 가졌고, 로마 교회는 동방 교회와의 균열을 우려했다. 피핀 3세 통치 말, 프랑크 왕국에서 Filioquela 조항 사용은 겐틸리 공의회(767)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Filioquela는 라틴 전례의 일부가 되었고, 8세기 말 샤를마뉴 궁정에서 채택되어 그의 영토로 퍼졌지만, 로마에서는 1014년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 이후, 샤를마뉴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타라시우스 총대주교를 비난했고, 교황 하드리아노 1세는 이를 거부했다. Filioquela에 대한 프랑크의 관점은 Libri Carolinila에서 강조되었고, 프랑크 신학자들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유출된다고 재확인했다. 8세기 말, 톨레도의 엘리판두스 주교와 리에바나의 베아투스 사이의 논쟁은 Filioquela 포함 신조 도입을 장려했다. 아퀼레이아의 파울리누스 2세는 Filioquela 삽입이 새로운 신조 금지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황 레오 3세는 Filioquela 추가를 승인하지 않았고, 810년 Filioquela 없이 신조를 게시하여 반대를 표명했다. 808년 또는 809년 예루살렘에서 수도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809년 아헨 공의회 (809)에서 Filioquela 신학이 표현되었다. 860년경,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포티우스 1세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그나티우스 사이의 분쟁으로 필리오퀘la 논쟁이 발발했다. 867년 포티우스는 서방 교회를 이단과 분열로 고발했고, 교황 니콜라오 1세를 파문했다.
포티우스는 성령의 영원한 유출에 대해 "그리고 아들로부터"와 "아들을 통하여"를 모두 배제하고, "오직 아버지로부터"라고 주장했다. 최소한 세 번의 공의회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렸다.
Filioquela가 추가된 라틴 전례 사용은 8세기와 11세기 사이에 퍼져나갔다. 1014년 교황 베네딕토 8세는 로마에서 미사 때 Filioquela가 추가된 신경을 부르게 했다. 리옹 제2차 공의회는 성령이 "두 원리로부터가 아닌 단일 원리로부터, 두 호흡이 아닌 단일 호흡에 의해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정의했다. 그 이후 Filioquela 구절은 라틴 교회 전체의 신경에 포함되었고,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권장되지 않았다.
개신교 종교 개혁은 필리오케la를 수용했지만, 맹렬히 주장하지는 않았다. 16세기 후반, 튀빙겐 대학교 루터교 학자들은 필리오케la를 옹호했다.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양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구분 | 동방 교회 (정교회) | 서방 교회 (천주교회, 개신교) |
|---|---|---|
| 성령의 발현 | 성부에게서만 발현 |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현 |
| 근거 | * 요한복음 15: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 * 요한복음 20:22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
| 신학적 입장 | * 성부만이 성령의 유일한 근원 | * 성부와 성자는 성령의 공동 근원 (단일 원리) |
| 신경 변경 문제 | * 보편공의회에서 결정된 신경은 교회의 동의 없이 변경 불가 | * 필리오퀘 추가는 신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정당한 발전 |
| 기타 | * 막시무스 콘페서는 필리오퀘를 아들을 통한 발현으로 해석하여 옹호 | *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서방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름 |
5. 1. 동방 교회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발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많은 인용구"를 제공한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어 동사 προϊέναιgrc(라틴어 procederela와 유사)와 προχεῖσθαιgrc(~로부터 흘러나오다)를 사용하며, 니케아 신경의 그리스어 본문에 나타나는 동사 ἐκπορεύεσθαιgrc는 사용하지 않았다.[18]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는 불가코프에 의해 그의 저술에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 밖으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둘 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본질로부터 오신다는 일련의 표현"을 제시한다고 언급된다. 불가코프는 "4세기 교부들의 가르침에는 필리오퀘 교리로부터의 반발의 영향으로 포티우스 이후 정교회 신학을 특징짓게 된 배타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다.[19]
카파도키아 교부들이든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든, 그리스 교부들에 관해서는, 성령이 아들로부터 발현한다는 후대의 신학에 대해 그들이 명시적으로 지지했는지 또는 부인했는지에 대한 주장은 역사적으로 양측에서 모두 주장되었지만, 인용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시에친스키는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한쪽 신학을 지지하는 데 사용된 중요한 원칙들을 천명했다. 여기에는 삼위일체 내에서 각 신적 위격의 고유한 위격적 특성, 특히 아버지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특성을 고집하는 것과, 비록 구별되지만 위격들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피조물에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내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영원한 발현(προϊέναιgrc)이 "아들을 통하여"(διὰ τοῦ Υἱοῦgrc) 이루어진다는 것을 포함한다.[20]
4세기 초,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두 개의 그리스어 동사 ἐκπορεύεσθαιgrc (381년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원본 그리스어 텍스트에 사용된 동사)와 προϊέναιgrc 사이에 구별이 이루어졌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성령은 진실로 성령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오시지만(προϊέναιgrc) 아들과 같은 방식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생이 아니라 발출(ἐκπορεύεσθαιgrc)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했다.[21]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라틴어 단어 procederela 및 그리스어 προϊέναιgrc의 의미로 "발출"한다는 것(그리스어 ἐκπορεύεσθαιgrc와 대조적으로)은 5세기 초 동방의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에 의해 가르쳐졌다.[22] 5세기 중반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타나시우스 신경과[23] 교황 레오 1세의 교리 서한[24]은 446년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된다고 선언했다.[25]
동방 교부들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된다는 가르침이 서방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이단을 간주하지 않았다.[26] 세르게이 불가코프에 따르면 "동방 교회에 의해 성인으로 존경받는 교황을 포함한 일련의 서방 저술가들은 또한 성령이 아들로부터 발출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이론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27] 447년에 레오 1세는 스페인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를 가르쳤고, 같은 해에 열린 반-프리스킬리아누스주의 공의회에서도 이를 선포했다.[28]
Filioquela는 톨레도 제3차 공의회 (589)에서 아리우스파에 반대하여 신경에 삽입되었는데,[29] 이 공의회에서 레카레드 1세 왕과 그의 서고트 왕국의 일부 아리우스파가 정통 가톨릭 기독교로 개종했다.[30] 톨레도 제11차 시노드(675)는 교리를 포함했지만 신앙 고백에 용어는 포함하지 않았다.[31] 다른 톨레도 시노드들은 589년에서 693년 사이에 "삼위일체 본질의 일치를 확인"했다.[32]
Filioquela 조항은 톨레도에서 열린 후속 시노드에 의해 확인되었고, 곧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크 왕국, 특히 클로비스 1세가 496년에 기독교로 개종한 후,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도 확산되었는데, 그곳에서 캔터베리 대주교 타르수스의 테오도로스(그리스인)가 주재한 헤트필드 공의회 (680)가 단성론에 대한 대응으로 이 교리를 강요했다.[33] 그러나 이 교리가 로마에서 가르쳐졌지만, 1014년까지 신경에서 전례적으로 선포되지 않았다.[34]
5. 1. 1. 동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는 보편공의회에서 결정된 신경을 교회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요한복음서 15장 26절에 따르면,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온다.[15] 만약 성자가 성부와 함께 성령을 나오게 한다면, 신성(神性)의 근원이 둘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성삼위에 두 개의 본질이 생기는 것이므로 성삼위일체 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16]시에치엔스키는 그리스 교부들이 성령과 아들의 신비로운 관계를 표현할 언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라틴 신학자들은 이미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ex Patre et Filio procedentemla)는 해답을 찾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가르침이 그리스 전통과 양립 가능한지 아니면 모순되는지는 16세기 이후에도 논쟁의 대상이라고 하였다.[17]
이브 콩가르는 "분리의 벽은 하늘만큼 높이 닿지 않는다"라고 언급했고, 에이단 니콜스는 "필리오케 논쟁은 사실 초기 교회의 신학적 다원주의의 희생자이다"라고 말하며, 라틴 및 알렉산드리아 전통과 카파도키아 및 후기 비잔틴 전통의 차이를 지적했다.
정교회에서 말하는 성신은 서방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과 같으며,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이자 신이며 사람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정교회와 서방 교회의 차이점은, 정교회에서는 "성신은 아버지로부터 발한다"고 하지만, 서방 교회에서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한다"고 하는 것이다.
5. 2. 서방 교회
- 보편공의회가 채택한 신경을 인정하여,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동의 없이 변개하지 못한다.
- 원문인 고대 그리스어 본문을 기준으로 삼는다.
- WCC 공동 신경을 채택하여 필리오퀘 문제가 없는 본문을 확인한다.
동방교회 전통의 동방 정교회와 오리엔트 정교회는 헬라어 원문의 니케아 신경을, 서방교회 전통의 천주교회 및 성공회는 필리오퀘가 있는 라틴어 니케아 신경을 받아들이며, 서방교회 전통의 개신교는 헬라어 원문 니케아 신경을 따른다. WCC 참여 개신교 교단들과 동방정교회 교단들은 WCC 공동 니케아 신경을 채택하여 헬라어 원문 니케아 신경을 교회 일치의 일환으로 기준으로 삼는다.

삼위일체의 위격들 간의 관계에서 한 위격은 유출을 통해서만 다른 위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λήμψεταιgrc) 수 있다고 주장된다.[3] 요한복음 20:22[3]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와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를 포함한 교부들에 의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둘 다로부터 본질적으로 유출된다"고 말하는 근거로 여겨졌다.[4] 다른 인용된 구절로는 갈라디아서 4:6,[5] 로마서 8:9,[6] 필립비서 1:19,[7]가 있는데, 여기에서 성령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며, 요한 복음에서 예수에 의해 성령이 보내지는 것에 대한 구절들[8]과 요한복음 16:7이 있다.[9] 요한계시록 22:1[10]은 천국의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로부터 유출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에첸스키(Siecienski)는 "신약 성경은 나중의 신학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처럼 성령의 유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나중에 삼위일체 신학을 형성한 신약 성경에 확립된 특정 원리들과 라틴인과 그리스인 모두가 Filioquela(필리오케)와 관련하여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용한 특정 구절들이 있다"고 말한다.[3]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발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많은 인용구"를 제공한다. 그는 그리스어 동사 προϊέναιgrc(라틴어 procederela와 유사)와 προχεῖσθαιgrc(~로부터 흘러나오다)를 사용하며, 니케아 신조의 그리스어 본문에 나타나는 동사 ἐκπορεύεσθαιgrc는 사용하지 않았다.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 밖으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둘 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본질로부터 오신다는 일련의 표현"을 제시한다고 언급된다.
카파도키아 교부들이든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이든, 그리스 교부들에 관해서는, 성령이 아들로부터 발현한다는 후대의 신학에 대해 그들이 명시적으로 지지했는지 또는 부인했는지에 대한 주장은 역사적으로 양측에서 모두 주장되었지만, 인용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한쪽 신학을 지지하는 데 사용된 중요한 원칙들을 천명했다.
원래의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어로 작성되었으며, 제1차 세계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채택되었는데, 성령의 발현에 대한 정의 없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성령의 발현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정의되었다. 전통적으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는 381년에 열린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는 칼케돈 공의회(451년)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며,[28] 공의회 회의록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모인 150명의 성부들의 신조"로 언급되었다. 이 신조는 칼케돈 공의회에서 교황 레오 1세에 의해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28] 학자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데, 이 신조는 니케아 신조의 단순한 확장본이 아니며, 니케아 신조와는 별개의 다른 전통적인 신조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높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는 대략적으로 니케아 신경에 성령에 대한 내용과 교회, 세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두 개의 조항을 더한 것과 같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 조항은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오신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요한복음 15:26을 근거로 한 구절이다.[21]
그리스어 단어 ἐκπορευόμενονgrc()은 발현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근원을 가리키지만, 라틴어 동사 procederela(그리고 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용어)는 매개 채널을 통해 발현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서방 교회는 그리스어 προϊέναιgrc()보다 더 유사한 더 일반적인 라틴어 procederela(나아가다; 나오다)를 사용했다. 더 구체적인 그리스어 ἐκπορεύεσθαιgrc(, "기원에서 나오다")보다.
에페소스 공의회는 325년 형태의 신조를 인용했으며, 381년의 신조는 인용하지 않았다. 니케아 신조에 대한 추가를 반대하는 에페소스 1차 공의회 제7조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Filioquela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사용된다. 서방 교회가 채택한 이 신조의 형태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Deum de Deola)과 "그리고 아들" (Filioquela)이라는 두 가지 추가 사항이 있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325년의 니케아 신경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가 모두 낭독되었는데, 전자는 한 주교의 요청에 의해, 후자는 주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대표의 주도로 낭독되었다.
4세기 초,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두 개의 그리스어 동사 ἐκπορεύεσθαιgrc (381년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원본 그리스어 텍스트에 사용된 동사)와 προϊέναιgrc 사이에 구별이 이루어졌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성령은 진실로 성령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오시지만(προϊέναιgrc) 아들과 같은 방식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출생이 아니라 발출(ἐκπορεύεσθαιgrc)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했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라틴어 단어 procederela 및 그리스어 προϊέναιgrc의 의미로 "발출"한다는 것(그리스어 ἐκπορεύεσθαιgrc와 대조적으로)은 5세기 초 동방의 알렉산드리아의 키릴에 의해 가르쳐졌다. 5세기 중반 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타나시우스 신경과[27] 교황 레오 1세의 교리 서한는 446년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된다고 선언했다.[28] 비록 동방 교부들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된다는 가르침이 서방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단을 간주하지 않았다. 447년에 레오 1세는 스페인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를 가르쳤고, 같은 해에 열린 반-프리스킬리아누스주의 공의회에서도 이를 선포했다.
Filioquela는 톨레도 제3차 공의회 (589)에 의해 아리안 반대 주가 추가되어 신경에 삽입되었다. 이 공의회에서 레카레드 1세 왕과 그의 서고트 왕국의 일부 아리우스파가 정통 가톨릭 기독교로 개종했다. 톨레도 제11차 시노드(675)는 교리를 포함했지만 신앙 고백에 용어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른 톨레도 시노드들은 589년에서 693년 사이에 "삼위일체 본질의 일치를 확인"했다. Filioquela 조항은 톨레도에서 열린 후속 시노드에 의해 확인되었고, 곧 스페인뿐만 아니라 프랑크 왕국, 특히 클로비스 1세가 496년에 기독교로 개종한 후,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도 확산되었는데, 그곳에서 캔터베리 대주교 타르수스의 테오도로스가 주재한 헤트필드 공의회 (680)가단성론에 대한 대응으로 이 교리를 강요했다. 그러나 이 교리가 로마에서 가르쳐졌지만, 1014년까지 신경에서 전례적으로 선포되지 않았다.
4세기와 5세기의 많은 라틴 교회 교부들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는데, 이는 현재 라틴어 버전의 니케아 신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 예로는 교황 다마소 1세의 신조,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와 교황 레오 1세가 있는데, 그는 "낳은 자, 낳은 자, 양자로부터 발출된 자가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불경한 자"로 규정했고, 그는 또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아버지로부터"의 원래 형태로 재확인한 칼케돈 공의회를 수용했으며, 나중에 그의 후계자 교황 레오 3세가 Filioquela로 표현된 가르침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지만, 신경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그 후, 리옹의 에케리우스, 마실리아의 겐나디우스, 보에티우스, 라벤나의 아그넬루스 주교, 카시오도루스, 투르의 그레고리우스는 성령이 아들로부터 발출된다는 생각이 (서방) 교회의 신앙의 일부로 확립되었다는 증인이며, 라틴 신학자들이 성령이 아들로부터 발출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는 일반적으로 성령이 아들로부터 발출된다고 가르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당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출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레고리오가 이러한 가르침을 옹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교부들은 또한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라는 구절을 사용한다. 성령이 성부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여러 번 분명히 밝힌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는 또한 성령이 성부로부터 온다고 말하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은 그에게 있어 상호 보완적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두 구절 모두를 받아들이며, 이들이 동일한 신앙의 실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신 약간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진실을 표현한다고 여긴다.[29]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서방의 신념에 대한 동방 기독교 대표의 첫 번째 기록된 반대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파울 2세 총대주교가 "필리오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교황 테오도로 1세 또는 교황 마르티노 1세를 비난했을 때 발생했다. 테오도로 1세는 단의설 때문에 647년에 파울 2세를 파문했다. 파울의 공격에 대응하여, 단의설을 반대하는 그리스인인 막시무스 콘페서는 로마인들이 "그리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
8세기 말과 9세기 초, 로마 교회는 필리오퀘 조항 사용과 관련하여 특이한 문제에 직면했다. 당시 프랑크 왕국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필리오퀘 조항이 실제로 원래 신조의 진정한 부분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 문제에 대처하려 했던 로마 교회는 프랑크 왕국의 자체적인 딸-교회와 동방의 자매-교회 사이의 벌어지는 균열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이 문제의 첫 징후는 프랑크 왕 피핀 3세의 통치 말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랑크 왕국에서 Filioquela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겐틸리 공의회(767)에서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5세의 사절들과 논란을 일으켰다. Credola를 미사에서 삽입하여 노래하는 관습이 서방에서 퍼지면서, Filioquela는 프랑크 왕국 전역의 라틴 전례의 일부가 되었다. 신조를 노래하는 관습은 8세기 말에 샤를마뉴의 궁정에서 채택되었고 이탈리아 북부 일부를 포함한 그의 모든 영토로 퍼졌지만, 1014년까지 그 사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로마로까지는 퍼지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는 제2차 니케아 공의회 이후 787년에 폭발했다. 샤를마뉴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타라시우스 총대주교를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신앙에 대한 불충실함으로 비난했는데, 이는 그가 성령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의 유출을 고백하지 않고 단지 "아들을 통하여" 유출된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황 하드리아노 1세는 이러한 비난을 거부하고 프랑크 왕에게 타라시우스의 성령론이 성부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설명하려 했다. Filioquela에 대한 프랑크의 관점은 791–793년경에 작성된 Libri Carolinila에서 다시 강조되었다. 프랑크 신학자들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유출된다는 개념을 재확인하고, 성령이 아버지 유출된다는 가르침을 부적절하다고 거부했다. 이러한 주장은 교회의 통일을 보존하는 데 오류가 있었고 위험했습니다.
그 당시, 또 다른 신학적 문제는 서방에서의 Filioquela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났습니다. 8세기 말, 톨레도의 엘리판두스 주교와 리에바나의 베아투스 사이에서 전자의 가르침(그것은 스페인 양자론이라고 불렸습니다)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785년에 교황 하드리아노 1세는 엘리판두스의 가르침을 비난했다. 이 논쟁은 양자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그의 세례에서 아들로 입양된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아들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Filioquela가 포함된 신조를 전례에 도입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아퀼레이아의 파울리누스 2세는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의 381년 신조에 Filioquela를 삽입하는 것은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자체가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325년 신조에 삽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조를 금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정치적 사건들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프랑크족이 새로운 교황 레오 3세가 신조에 Filioquela를 추가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하려는 노력은 800년에 로마에서 황제로 대관한 샤를마뉴가 동방에 대한 이단 혐의를 제기할 근거를 찾고 싶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황이 신조에 Filioquela를 삽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동방과 서방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피했습니다. 프랑크 교회가 필리오퀘를 신조 바깥에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로마 교회의 입장을 채택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프랑크의 아헨 공의회 (809)에서 Filioquela 조항이 다시 지지되자 교황 레오 3세는 그의 승인을 거부하고 정통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작성된 두 개의 은색 명판에 Filioquela 없이 로마에 신조를 공개적으로 게시(810)하여 신조에 Filioquela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레오 3세는 Filioquela 교리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교황은 조항이 신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크 교회의 신조에서 필리오퀘 조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808년 또는 809년에 한 수도원의 그리스 수도사들과 다른 수도원의 프랑크 베네딕토회 수도사들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명백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은 후자에게 다른 것들 중에서도 Filioquela가 포함된 신조를 노래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Filioquela의 신학은 809년 현지 아헨 공의회 (809)에서 표현되었습니다. 860년경, 필리오퀘la 논쟁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포티우스 총대주교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그나티우스 총대주교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발발했다. 867년 포티우스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였으며, '동방 총대주교들에게 보내는 회람'을 발표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공의회를 소집했는데, 이 공의회에서 그는 관습의 차이, 특히 필리오퀘la와 교황의 권위 때문에 서방 교회를 이단과 분열로 고발했다. 이로 인해 문제는 관할권과 관습에서 교리로 옮겨갔다. 이 공의회는 교황 니콜라오 1세를 저주하고 파문했으며 폐위시켰다.
포티우스는 성령의 영원한 유출에 관하여 "그리고 아들로부터"(and the Son)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through the Son)도 배제했다. 그는 성령의 영원한 유출은 "오직 아버지로부터"라고 주장했다. 이 문구는 언어적으로 새로운 것이었지만,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본질에서 이 문구가 전통적인 가르침의 재확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포티우스의 중요성은 동서 관계와 관련하여 지속되었다. 그는 동방 정교회에 의해 성인으로 인정받았으며 그의 비판 노선은 종종 나중에 반복되어 동서 간의 화해를 어렵게 만들었다. 최소한 세 번의 공의회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렸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867)는 포티우스가 소집하여 모든 교회의 교황 수위와 필리오퀘la 사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867년 공의회 이후, 869년 로마 교구에서 이전 공의회를 뒤집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제4차 공의회(로마 가톨릭)가 열렸다. 879년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제4차 공의회(동방 정교회)가 열려 포티우스를 그의 자리에 복귀시켰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Filioquela가 추가된 형태의 라틴 전례 사용은 8세기와 11세기 사이에 퍼져나갔다. 1014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 로마에 왔던 독일의 헨리 2세 국왕의 요청에 따라, 교황 베네딕토 8세는 로마에서 미사 때 처음으로 Filioquela가 추가된 신경을 부르게 했다.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Filioquela가 훨씬 늦게 신경에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1098년의 바리 공의회 이후 이탈리아 남부 일부 지역[32]과 파리에서는 1240년경까지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리옹 제2차 공의회가 성령이 "두 원리로부터가 아닌 단일 원리로부터, 두 호흡이 아닌 단일 호흡에 의해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정의하기 34년 전의 일이다. 그 이후로 Filioquela 구절은 전례에서 그리스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틴 교회 전체의 신경에 포함되었다.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 이 구절의 채택은 권장되지 않았다.
개신교 종교 개혁은 여러 교회 교리에 도전했지만, 필리오케la는 아무런 유보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서방 교회의 견해를 맹렬히 주장하지는 않았다. 16세기 후반, 튀빙겐 대학교의 루터교 학자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예레미아스 2세 총대주교와 대화를 시작했다. 튀빙겐 루터교인들은 필리오케la가 없으면 "삼위일체 교리가 계시 역사의 인식론적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옹호했다.[38] 이후 수 세기 동안, 필리오케la는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지만, 개신교 신학의 중심으로까지 강조되지는 않았다.[38]
5. 2. 1. 천주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한다고 본다. 이는 삼위일체 하느님 내에서 성부와 성자가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따라서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발한다는 동방교회의 주장은 삼위일체의 일치보다는 차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오히려 삼위일체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본다.[4]로마 가톨릭 교회는 필리오퀘를 추가한 것이 신경의 변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을 강화하는 것이며, 필리오퀘가 없는 신경의 원문이나 성경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므로 성부와 성자가 함께 동일한 성령을 발한다는 것이다.[3]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필리오퀘가 삼위일체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오히려 신앙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5. 2. 2. 개신교회
개신교는 필리오퀘를 이의 없이 수용하였으나, 삼위일체에 대한 서방 교회의 관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 16세기 후반, 튀빙겐 대학교의 루터교 학자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예레미아스 2세 총대주교와 대화를 시작했다. 튀빙겐 루터교인들은 필리오퀘가 없을 경우 "삼위일체 교리가 계시 역사의 인식론적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옹호했다.[38]이후 수 세기 동안, 필리오퀘는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지만, 개신교 신학의 중심으로까지 강조되지는 않았다.[38] 지지울라스는 개신교가 "'~로부터 나온다'와 '~에 의해 보내진다'를 구분할 수 없었던 4세기 신학자들과 같은 혼란에 빠졌다"고 평가한다.[39]
개신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리오퀘를 옹호한다.
- 성부와 성자는 공동체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온다는 동방 교회의 주장은 성삼위의 일치보다 차이를 강조하여 삼위일체의 정신에 어긋난다.
- 필리오퀘를 추가하는 것은 신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며, 필리오퀘가 없는 신경 원문이나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므로, 성부와 성자가 함께 동일한 성령을 보낸다는 것은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정신과 일치한다.
- 필리오퀘는 성삼위일체의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오히려 신앙의 오류이다.
6. 니케아 신경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수정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하 '니케아 신경')의 그리스어 원문에는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發)하시고"(τό εκ τού Πατρός εκπορευόμενον|토 에크 투 파트로스 에크포류오메논grc[83])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589년 제3차 톨레도 시노드에서 서방교회가 라틴어로 번역한 니케아 신경에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qui ex Patre '''Filióque''' procédit|퀴 엑스 파트레 필리오퀘 프로체디트la[84])라고 '''필리오퀘'''(Filióquela)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 이는 코이네 그리스어가 신학 표준 언어였던 상황에서, 번역어인 라틴어의 문제였고, 중요한 신앙 기준인 니케아 신경의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은 문제이며, 신학적 문제이기도 했다.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수정된 니케아 신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리스어 원본 | 라틴어 번역 | 한국어 번역 |
|---|---|---|
| Καὶ εἰς τὸ Πνεῦμα τὸ Ἅγιον, τὸ Κύριον, τὸ ζῳοποιόνgrc | Et in Spiritum Sanctum, Dominum et vivificantem,la | 성령,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
| τὸ ἐκ τοῦ Πατρὸς ἐκπορευόμενον,grc | qui ex Patre procedit,la |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분, |
| τὸ σὺν Πατρὶ καὶ Υἱῷ συμπροσκυνούμενον καὶ συνδοξαζόμενον,grc | qui cum Patre, et Filio simul adoratur, et cum glorificatur,la |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경배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분, |
Filioquela("성자에게서도")라는 단어가 삽입되면서 논쟁이 발생하였다.
| 그리스어 | 라틴어 | 한국어 번역 |
|---|---|---|
| τὸ ἐκ τοῦ Πατρὸς | qui ex Patre | 성부와 로부터 나오시는 분, |
이로 인해 동방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리스어 니케아 신경과 서방 교회에서 번역한 라틴어 니케아 신경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7. 논쟁
필리오케 논쟁은 크게 네 가지 주요 논쟁점을 포함한다.[27]
- 필리오케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논쟁
- 필리오케라는 용어가 나타내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교리의 정통성에 대한 논쟁
-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해당 용어를 삽입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
- 교리의 정통성을 정의하거나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해당 용어를 삽입할 교황의 권위에 대한 논쟁
이러한 이견들 중에서 교리에 대한 이견이 신경에 삽입하는 것에 대한 이견보다 먼저 있었지만, 11세기에 교황이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해당 용어의 삽입을 승인하면서 세 번째 이견과 연결되었다.[27] 앤서니 시엔스키는 "궁극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성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성, 교회의 가르치는 권위, 그리고 지도자들 간의 권력 분배였다"라고 썼다.[27]
휴버트 컨리프-존스는 필리오케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동방 정교회 견해를 "자유주의적" 견해와 "엄격주의적" 견해로 구분한다.[27] "자유주의적" 견해는 이 논쟁을 상호 오해의 문제로 보며, 동서 양측이 "다양한 신학"을 허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27] 이들은 양측이 자신의 신학적 틀만을 유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논쟁이 상충하는 교리가 아닌 서로 다른 ''테올로게메''(신학적 관점)에 관한 것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본다.[27]
그러나 포티우스, 에페소스의 마르크, 블라디미르 로스키와 같은 20세기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은 "엄격주의적" 견해를 제시하며, 필리오케 문제가 교리의 근본적인 문제이며 단순한 ''테올로게메'' 중 하나로 치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27] "엄격주의적"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필리오퀘가 서방 교회가 성령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심각한 교리적 오류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27]
시엔스키는 20세기에 필리오케를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사이의 권력 투쟁에서 또 다른 무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분쟁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신학적 문제는 교회론적 관심사를 훨씬 능가했다고 언급한다.[27] 시엔스키에 따르면, 더 깊은 질문은 동방과 서방 기독교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서로 다르고 궁극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가르침"을 발전시키게 되었는지 여부였다.[27] 또한, 동서방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양립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8세기 또는 9세기경부터 분쟁의 양측의 기독교인들이 차이점이 조정 불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종속되었다고 주장한다.[27]
서방의 관점에서 볼 때, 동방의 필리오퀘 거부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 본질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암호 아리우스주의였다.[27] 동방에서는 필리오퀘의 삽입이 서방이 "실질적으로 다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징후로 보았다.[27] 시엔스키는 권력과 권위가 논쟁의 핵심 문제였던 만큼, 상대방이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성령의 발현에 대한 교부들의 명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믿음에 감정이 격앙되어 증오의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27]
8. 현대의 입장
현대에 이르러 필리오퀘 문제는 여전히 기독교 교파 간의 중요한 신학적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각 교파는 성경과 전통에 대한 고유한 해석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가톨릭 교회: 성부와 성자가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성령은 성부에게서만이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나온다고 본다. 필리오퀘를 통해 성삼위의 일치를 강조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신앙의 오류라고 주장한다. 다만, 보편공의회가 채택한 신경을 존중하며, 원문인 고대 그리스어 본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성공회: 삼위일체 교리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본질적으로 유출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등의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며, 필리오퀘를 통해 성삼위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 개신교: 대체로 필리오케를 수용하지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요소로만 여길 뿐, 신학의 기둥으로 격상시키지는 않는다. 칼 바르트와 같은 일부 신학자들은 필리오케 삭제를 반대하며, 모라비아 교회와 같이 필리오케를 사용하지 않는 교파도 존재한다.
- 동방 정교회: 성령이 "한 분 하느님, 한 분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기원한다고 본다. 필리오케를 이단으로 간주하며,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필리오케를 추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막시무스 콘페서와 같은 일부 성인들은 필리오케를 정당화했지만, 이는 신경의 맥락이 아닌 다른 맥락에서였다.
- 오리엔트 정교회: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원문을 사용하며, 필리오케 조항이 없다.
- 동방 교회: 아시리아 동방 교회와 고대 동방 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암송할 때 "성자(聖子)를 통하여"라는 구절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각 교파는 필리오퀘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 신학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8. 1.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는 성부와 성자가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온다는 동방교회의 주장은 성삼위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일치를 해친다고 비판한다.가톨릭 교회는 필리오퀘(Filioque)를 추가한 것이 신경의 원래 의미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필리오퀘가 없어도 신경의 원문이나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므로, 성부와 성자가 함께 성령을 낸다는 것이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는 성삼위일체의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오류라고 주장한다.
가톨릭 교회는 보편공의회가 채택한 신경을 존중하지만,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동의 없이 신경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원문인 고대 그리스어 본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교회협의회(WCC) 공동 신경은 필리오퀘 문제가 없는 본문을 채택하여 교회 일치에 기여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동방 정교회와 개신교 등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8. 2. 성공회
성공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삼위일체 내 위격 간의 관계에서 한 위격은 유출을 통해서만 다른 위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4]요한복음 20:22[3]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와 같은 교부들에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본질적으로 유출된다는 근거로 해석되었다. 또한 갈라디아서 4:6,[5] 로마서 8:9,[6] 빌립보서 1:19[7]에서 성령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며, 요한복음의 여러 구절[8]과 요한복음 16:7[9]에서 예수가 성령을 보내는 내용이 언급된다. 요한계시록 22:1[10]은 천국의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유출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요한복음 14:26과 15:26은 성령이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는다는 내용과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성령의 유출에 대한 이해에 긴장감을 조성한다. 시에첸스키(Siecienski)는 신약 성경이 성령의 유출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삼위일체 신학의 기초가 된 특정 원리들과 Filioquela(필리오케) 논쟁에서 양측이 사용한 특정 구절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4] 반면, 벨리-마티 캐르캐이넨은 동방 정교회가 성령의 이중 유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점을 Filioquela(필리오케)가 신학적으로 잘못된 교리라는 증거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제1차 세계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채택된 원래의 니케아 신조는 그리스어로 작성되었으며, 성령의 발현에 대한 정의 없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문장으로 끝맺었다. 성령의 발현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에서 정의되었는데, 이 신조 역시 그리스어로 작성되었다. 전통적으로 이 신조는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며, 주로 동방 주교들이 참석하여 문제를 결정했다.[19]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는 칼케돈 공의회(451년)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며,[28] 공의회 회의록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모인 150명의 성부들의 신조"로 언급되었다. 이 신조는 칼케돈 공의회에서 교황 레오 1세에 의해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28] 학자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데, 이 신조는 니케아 신조의 단순한 확장본이 아니라, 니케아 신조와는 별개의 다른 전통적인 신조에 기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20]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는 니케아 신조에 성령, 교회, 세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두 신조의 전체 내용은 325년 신조와 381년 신조 비교 참조)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는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오신다"고 고백하며, 이는 요한복음 15:26을 근거로 한다.[21] 그리스어 단어 ()은 발현의 궁극적인 근원을 가리키지만, 라틴어 동사 (그리고 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데 사용되는 관련 용어)는 매개 채널을 통한 발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프레데릭 보어슈미트는 중세 신학자들이 간과한 것은 동서양 모두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 용어 간의 "의미적 차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였다고 지적한다. 서방 교회는 더 일반적인 라틴어 procederela(나아가다, 나오다)를 사용했고, 동방 교회는 더 구체적인 그리스어 ἐκπορεύεσθαιgrc(, "기원에서 나오다")를 사용했다. 서방 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용어를, 동방 교회는 두 개의 용어를 사용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동일하고 상호 보완적인 의미, 즉 성부로부터 하고, 성자로부터 하는 것을 전달했다.
교부들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라는 구절도 사용한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여러 번 분명히 밝혔고, 또한 성령이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온다고 말하며, 이 두 표현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두 구절 모두를 받아들이며, 이들이 동일한 신앙의 실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진실을 표현한다고 여긴다.[29]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으로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라는 구절이 서방 세계 전역에 퍼졌지만, 동방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필립 샤프에 따르면 "성자를 통하여"는 나중에 "성자로부터" 또는 "그리고 성자"와 거의 동일하게 여겨져 삭제되거나 거부되기도 했다.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서방의 신념에 대한 동방 기독교 대표의 첫 반대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파울 2세 총대주교(재위: 642-653년)가 "필리오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교황 테오도로 1세(재위: 642-649년) 또는 교황 마르티노 1세(재위: 649-653년)를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 단의설에 반대했던 그리스인 막시무스 콘페서는 로마인들이 "라틴 교부들의 만장일치의 증거와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의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로마인들이 아들을 성령의 원인으로 만들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고,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유일한 원인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틴어와 그리스어 간의 언어 차이가 상호 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8세기 말과 9세기 초, 로마 교회는 프랑크 왕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필리오퀘 조항이 원래 신조의 진정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교황 하드리아노 1세와 교황 레오 3세는 교회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프랑크 왕국에서 Filioquela 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겐틸리 공의회(767년)에서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5세의 사절들과 논쟁을 일으켰다. Credola를 미사에서 삽입하여 노래하는 관습이 서방에서 퍼지면서, Filioquela는 프랑크 왕국 전역의 라틴 전례의 일부가 되었다. 신조를 노래하는 관습은 8세기 말 샤를마뉴의 궁정에서 채택되었고 그의 모든 영토로 퍼졌지만, 1014년까지 로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2차 니케아 공의회 이후 787년, 샤를마뉴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타라시우스 총대주교가 성령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의 유출을 고백하지 않고 "아들을 통하여" 유출된다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했다. 교황 하드리아노 1세는 이러한 비난을 거부하고 타라시우스의 성령론이 성부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Filioquela에 대한 프랑크의 관점은 791–793년경에 작성된 Libri Carolinila에서 다시 강조되었다. 프랑크 신학자들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유출된다는 개념을 재확인하고,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유출된다는 가르침을 부적절하다고 거부했다.
8세기 말, 톨레도의 엘리판두스 주교와 리에바나의 베아투스 사이에서 스페인 양자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엘리판두스는 우르젤의 펠릭스 주교의 지지를 받았다. 785년에 교황 하드리아노 1세는 엘리판두스의 가르침을 비난했다. 이 논쟁은 양자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Filioquela가 포함된 신조를 전례에 도입하도록 장려했다.
프리울리 공의회에서 아퀼레이아의 파울리누스 2세는 Filioquela를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신조를 금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금지된 것은 "아버지들의 신성한 의도에 반하여"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지, 공의회가 아버지들의 의도와 고대 교회의 신앙과 일치함을 보여줄 수 있는 추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존 메이엔도르프와 존 로마니데스에 따르면, 프랑크족이 교황 레오 3세가 신조에 Filioquela를 추가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하려 한 것은 샤를마뉴가 동방에 대한 이단 혐의를 제기할 근거를 찾고 싶어했기 때문이었다.[30] 교황이 신조에 Filioquela를 삽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동서 간의 갈등을 피하게 했다.
프랑크 교회가 필리오퀘를 신조 바깥에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로마 교회의 입장을 계속 거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프랑크의 아헨 공의회 (809)에서 Filioquela 조항이 다시 지지되자 교황 레오 3세는 그의 승인을 거부하고 정통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Filioquela 없이 로마에 신조를 공개적으로 게시(810)했다. 레오 3세는 Filioquela 교리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조항이 신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었다.
808년 또는 809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수도사들과 프랑크 베네딕토회 수도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리스인들은 후자에게 Filioquela가 포함된 신조를 노래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응하여 Filioquela의 신학은 809년 아헨 공의회 (809)에서 표현되었다.
860년경, 필리오퀘la 논쟁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포티우스 총대주교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그나티우스 총대주교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발발했다. 867년 포티우스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였으며, '동방 총대주교들에게 보내는 회람'(Encyclical to the Eastern Patriarchs)을 발표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공의회를 소집했는데, 이 공의회에서 그는 필리오퀘la와 교황의 권위 때문에 서방 교회를 이단과 분열로 고발했다. 이로 인해 문제는 관할권과 관습에서 교리로 옮겨갔다.
포티우스는 성령의 영원한 유출에 관하여 "그리고 아들로부터"(and the Son)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through the Son)도 배제했다. 그에게 "아들을 통하여"는 성령의 일시적인 파견(시간 속에서의 파견)에만 적용되었다. 그는 성령의 영원한 유출은 "오직 아버지로부터"라고 주장했다.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본질에서 이 문구가 전통적인 가르침의 재확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세르게이 불가코프는 포티우스의 교리 자체가 "동방 교회에 일종의 새로운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포티우스의 중요성은 동서 관계와 관련하여 지속되었다. 그는 동방 정교회에 의해 성인으로 인정받았으며 그의 비판 노선은 종종 나중에 반복되어 동서 간의 화해를 어렵게 만들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867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제4차 공의회(로마 가톨릭)(869), 콘스탄티노폴리스 제4차 공의회(동방 정교회)(879)는 이그나티우스를 폐위시키고 포티우스를 그 자리에 임명한 황제 미카엘 3세의 행동에 관해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렸다.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867)는 포티우스가 소집하여 필리오퀘la 사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31]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Filioquela가 추가된 형태의 라틴 전례 사용은 8세기와 11세기 사이에 퍼져나갔다.[28] 1014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식을 치르기 위해 로마에 왔던 독일의 헨리 2세 국왕의 요청에 따라, 교황 베네딕토 8세는 로마에서 미사 때 처음으로 Filioquela가 추가된 신경을 부르게 했다.
그 이후로 Filioquela 구절은 그리스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라틴 교회 전체의 신경에 포함되었다.[33] 동방 가톨릭 교회(이전에는 유니에이트 교회로 알려짐)에서 이 구절의 채택은 권장되지 않았다.[40]
8. 3. 개신교회
개신교 종교 개혁은 여러 교회 교리에 도전했지만, Filioque|필리오케la는 아무런 유보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서방 교회의 견해를 맹렬히 주장하지는 않았다. 16세기 후반, 튀빙겐 대학교의 루터교 학자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예레미아스 2세 총대주교와 대화를 시작했다. 튀빙겐 루터교인들은 Filioque|필리오케la가 없으면 "삼위일체 교리가 계시 역사의 인식론적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옹호했다.[38] 그 후 수세기 동안, Filioque|필리오케la는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지만, 개신교 신학의 기둥으로 격상되지는 않았다.[38] 지지울라스는 개신교가 "출생의 두 종류, '~로부터 나온다'와 '~에 의해 보내진다'를 구분할 수 없었던 4세기 신학자들과 같은 혼란에 빠졌다"고 특징짓는다.[39]20세기 칼 바르트는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 중 아마도 ''필리오케'' 교리를 가장 확고하게 옹호한 인물이었다. 바르트는 기독교 교회의 재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리오케''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했다. 바르트의 ''필리오케'' 옹호는 20세기 후반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전례에서 ''필리오케'' 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에 반하는 것이었다.
모라비아 교회는 ''필리오케''를 사용한 적이 없다.
8. 4. 동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는 삼위일체에서 한 위격이 다른 위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은 유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3] 요한복음 20:22[3], 갈라디아서 4:6,[5] 로마서 8:9,[6] 빌립보서 1:19[7], 요한복음 16:7[9], 요한계시록 22:1[10] 등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 등 교부들이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본질적으로 유출된다고 해석한 근거이다. 요한 복음에서 예수가 성령을 보내는 것에 대한 구절들[8]도 같은 맥락에서 인용된다.요한복음 14:26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요한복음 15:26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언급한다.
시에첸스키는 신약 성경이 성령의 유출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삼위일체 신학의 기초가 된 원리들과 Filioquela(필리오케) 관련 입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벨리-마티 캐르캐이넨은 동방 정교회가 성령의 이중 유출에 대한 명시적 언급 부재를 필리오케 교리의 신학적 오류에 대한 증거로 본다고 말한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발현'한다는 암시 구절들을 제시하며 προϊέναι|프로이에나이grc(라틴어 procedere|프로체데레la와 유사)와 προχεῖσθαι|프로케이스따이grc(~로부터 흘러나오다)를 사용했지만, 니케아 신경의 그리스어 본문에 쓰인 ἐκπορεύεσθαι|에크포류에스타이grc는 쓰지 않았다.
동방 정교회는 필리오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공의회적 선언을 한 적은 없지만, 성령이 "한 분 하느님, 한 분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기원하며 존재의 원인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블라디미르 로스키 등은 성령의 이중 발원이 동방 정교회 신학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진술은 ''시간 속에서'' 성령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면 정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은 니케아 신경이 교회 신학, 특히 삼위일체 이해를 다루기 위한 것이며, 신약성서 구절은 성령의 존재론이 아닌 경륜을 말하고, 서방 신학자들의 삼위일체 위격의 본질 기원 선언은 사벨리우스주의 이단이라고 비판한다.
현대 정교회 신학은 필리오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전통주의"와 "필리오케에 덜 반대하는" 학자들로 나뉜다.
8. 4. 1. 동방 정교회 성인들의 견해
막시무스 참회자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라틴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45] 그러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포티오스 1세,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에페소스의 마르코스를 포함한 동방 정교회 성인들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필리오케''를 추가하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들은 때로는 정교회의 세 기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45]하지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진술은, "아들로부터의 발출"이 성령에게 존재나 본질을 부여하는 삼위일체 내의 영원하고 이중적인 발출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성령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문맥이 명확하다면 정통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45] 따라서 동방 정교회 사상에서 막시무스 참회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맥락이 아닌 다른 맥락에서 서방의 ''필리오케'' 사용을 정당화했다.[45] 오흐리드의 테오필라크트 성인 역시 그 차이가 실제로는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에 관습 문제에 대해 화해의 정신을 촉구했다.[47][48][49]
나프팍토스의 메트로폴리탄 히에로테오스(블라호스)에 따르면, 동방 정교회 전통에서는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381년 제2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채택된 성령에 관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부분을 작성했다.[50] 시에친스키는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서방에서 나중에 이해된 대로 ''필리오케''를 신경에 추가하는 것을 지지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성령이 아들과의 영원한 관계, 단순히 경제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를 맺고 있다"고 추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언급한다.[50]
8. 4. 2. 동방 정교회의 로마 가톨릭 신학관
동방 정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필리오케 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편공의회에서 확정한 신경을 전체 교회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 요한복음서 15장 26절에 따르면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15]
- 성자가 성부와 함께 성령을 발한다면, 신성(神性)의 근원이 둘이 되는 것이다.
- 성삼위에 2개의 본질이 성립하면 성삼위일체 교리에 위배되므로, 이는 신앙의 오류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로스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발현'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제시했지만, 니케아 신경의 그리스어 본문에 사용된 '발출하다'(ἐκπορεύεσθαι|에크포류에스타이grc)는 동사는 사용하지 않았다.
살라미스의 에피파니우스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 밖으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둘 다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본질로부터 오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4세기 교부들의 가르침에는 필리오케 교리에 대한 명확한 반대나 배타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카파도키아 교부들과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은 성령이 아들로부터 발현한다는 후대 신학에 대해 명시적인 지지나 부인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삼위일체 내 각 위격의 고유한 특성과 아버지의 유일한 원인 됨, 위격들의 구별과 분리 불가능성, 성령이 피조물에게 보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내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영원한 발현(προϊέναι|프로이에나이grc)이 "아들을 통하여"(διὰ τοῦ Υἱοῦ|디아 투 히우grc)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원칙들을 천명했다.
동방 정교회는 필리오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공의회적 선언을 한 적은 없지만, 성령이 "한 분 하느님, 한 분 아버지"이시므로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기원하며 존재의 원인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블라디미르 로스키를 비롯한 여러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이중으로 발원한다는 개념이 동방 정교회 신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막시무스 참회자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라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지만,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필리오케''를 추가하는 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포티오스 1세,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에페소스의 마르코스 등 동방 정교회 성인들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진술이 ''시간 속에서'' 성령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면 정통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나프팍토스의 메트로폴리탄 히에로테오스(블라호스)에 따르면, 동방 정교회 전통에서는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381년 제2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채택된 성령에 관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부분을 작성했다. 그러나 시에친스키는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서방에서 이해된 대로 ''필리오케'' 추가를 지지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은 신앙 고백이자 교리로서의 니케아 신경이 교회의 신학, 특히 하나님의 정통 삼위일체 이해를 다루고 정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신약성서 구절이 성령의 존재론이 아닌 경륜을 말하며, 서방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의 모든 위격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기원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사벨리우스주의의 이단이라고 비판한다.
동방 정교회 신학은 아버지 위격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아버지가 구약성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만물의 근원이며, 이는 아버지 안의 한 분 하느님에 대한 정교회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이다. 동방 정교회 신학에서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음, 또는 존재, 또는 본질은 그리스어로 ''ousia''라고 불린다.
현대 정교회 신학은 필리오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전통주의"를 고수하는 학자들과 "필리오케에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학자들로 나뉜다. 칼 바르트는 동방 정교회에서 우세한 견해가 바실리 볼로토프의 견해라고 생각했는데, 볼로토프는 신조가 필리오퀘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 문제가 분열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브 콩가르는 대다수의 정교회 신자들이 필리오케를 이단이나 교리적 오류가 아니라 허용 가능한 신학적 견해, 즉 '테올로구메논'으로 본다고 말했다.
8. 4. 3. 동방 정교회 신학
동방 정교회는 필리오퀘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특정 공의회적 선언을 한 적이 없다.[45]동방 정교회는 성령이 "한 분 하느님, 한 분 아버지"이므로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기원하며 존재의 원인(존재 방식)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블라디미르 로스키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서 이중으로 발원한다는 개념은 동방 정교 신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키에게 이러한 양립 불가능성은 매우 근본적이어서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성령의 발원에 대한 문제는 동서 교회의 분열의 유일한 교리적 근거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로스키의 견해를 공유하는 동방 정교회 학자로는 두미트루 스탠일로에, 존 로마니데스, 크리스토스 야나라스,[46] 미하일 포마잔스키가 있다. 하지만, 세르게이 불가코프는 필리오퀘가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재결합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막시무스 참회자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라틴족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지만,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필리오케''를 추가하는 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포티오스 1세,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에페소스의 마르코스를 포함한 동방 정교회 성인들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었으며, 때로는 정교회의 세 기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진술은 "아들로부터의 발출"이 성령에게 존재나 본질을 부여하는 삼위일체 내의 영원하고 이중적인 발출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성령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문맥상 명확하다면 정통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동방 정교회 사상에서 막시무스 참회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맥락이 아닌 다른 맥락에서 서방의 ''필리오케'' 사용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성령이 아들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동방의 공식에 대한 합법적인 변형"으로 옹호했다. 오흐리드의 테오필라크트 성인 역시 그 차이가 실제로는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습 문제에 대해 양측에 화해의 정신을 촉구했다.[47][48][49]
나프팍토스의 메트로폴리탄 히에로테오스(블라호스)에 따르면, 동방 정교회 전통에서는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381년 제2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채택된 성령에 관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부분을 작성했다.[50] 시에친스키는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서방에서 나중에 이해된 대로 ''필리오케''를 신경에 추가하는 것을 지지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니사의 그레고리오스가 "성령이 아들과의 영원한 관계, 단순히 경제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를 맺고 있다"고 추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예: 포마잔스키)은 신앙 고백으로서, 교리로서의 니케아 신경은 교회의 신학, 특히 하나님의 정통 삼위일체 이해를 다루고 정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교회 밖에서 여겨지는 가르침에 반하여 정확하게 표현된 하나님의 위격(Hypostases) 안에 있다. 니케아 신경의 아버지 위격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은 (라틴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신약성서 구절이 성령의 존재론이 아닌 경륜을 말하며,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방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의 모든 위격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기원한다고 선언하는 등 추가적인 교리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한다(이는 사벨리우스주의의 이단이다).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은 이것을 테오리아를 통한 실제적 경험이 아닌 철학적 사변의 가르침으로 본다.
아버지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창조되지 않은 실재이며, 그리스도와 성령 또한 영원하고, 무한하며, 창조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기원은 하나님의 본질(ousia)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위격에 있다. 성령의 이중 출생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마케도니우스 1세와 그의 종파인 프뉴마토마키의 가르침과 유사하며, 성령은 아들에 의해 창조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종이다. 마케도니우스의 입장은 성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최종적으로 니케아 신경에서 성령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다음은 동방 정교회와 논쟁 중인 ''필리오퀘''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리의 선언이다.
- 라테란 공의회 4차 (1215): "아버지는 아무에게서도 나오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만, 성령은 둘 다에게서 동일하게 나온다."
- 리옹 공의회 2차, 회기 2 (1274):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며, 두 근원에서가 아니라 한 근원에서, 두 영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에 의해서 나온다고 고백한다."
- 피렌체 공의회, 회기 6 (1439): "우리는 거룩한 박사와 교부들이 성령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때, 이는 또한 아들이 성령의 실존의 원리로서 그리스인들에게는 원인으로, 라틴인들에게는 원리로 의미되어야 하며,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51]
- 피렌체 공의회, 회기 8, ''Laetentur Caeli''(1439), 그리스인과의 연합에 관하여: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simul) 그 본성과 실존을 갖는다. 그분은 두 분으로부터 한 근원과 한 영출을 통하여 영원히 나오신다. ... 그리고 아버지가 독생자에게 아버지에 속하는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아들은 또한 그에게서 영원히 태어났고, 그로부터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 피렌체 공의회, 회기 11 (1442), ''Cantate Domino'', 콥트족 및 에티오피아인과의 연합에 관하여: "아버지, 아들, 성령; 본질에 있어서 하나, 위격에 있어서 셋; 낳아지지 않은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낳아진 아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 성령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 나오신다. ... 성령이 무엇이든, 그가 가진 것은 아들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의 두 원리가 아니라 한 원리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창조의 세 원리가 아니라 한 원리이다."
- 특히 리옹 공의회 2차, 회기 2 (1274)에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또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두 근원에서가 아니라 한 근원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단죄.
이러한 정통교회의 판단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로부터 (동등하게) 그 기원과 존재를 얻는다고 로마 가톨릭 교리로 가르치고 있으며, 이는 ''필리오퀘''를 이중 출생으로 만든다.
동방 정교회는 서방이 여러 종류의 신학적 ''필리오퀘''를 통해 성령의 다른 기원과 원인을 가르치고 있다고 인식한다. 즉, 교리적 로마 가톨릭 ''필리오퀘''를 통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보다 열등하며, 모든 것의 근원인 아버지 위격으로부터 그 창조되지 않음을 받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아버지와 동등한 위격이 아니다. 삼위일체는 메시지, 전달자, 계시자, 또는 마음, 말씀, 의미의 아이디어를 표현한다. 동방 정교회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교제이시기에 항상 그 말씀과 성령과 함께 존재하는, 창조되지 않고 기원하지 않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즉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동방 정교회 기독교 신학은 아버지 위격, 즉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아버지가 구약성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만물의 근원이며, 이는 아버지 안의 한 분 하느님, 즉 아버지의 본질(무에서 온 것은 아버지에게서 비롯되는데, 이는 아버지가 곧 그것이기 때문이다)에 대한 정교회의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동방 정교회 신학에서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음, 또는 존재, 또는 본질은 그리스어로 ''ousia''라고 불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되지 않은 아버지(하느님)의 아들(신의 사람)이시다. 성령은 창조되지 않은 아버지(하느님)의 영이시다.
하느님은 존재의 실존(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은 서방에서는 "인격"이라는 단어로 번역된다. 하느님의 각 위격은 하느님의 특정한 고유한 실존이다. 각각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다(근원으로부터, 근원 없이, 아버지(하느님)로부터, 그들은 창조되지 않았다). 하느님의 위격을 구성하는 각 고유한 속성은 환원주의적이지 않으며 공유되지 않는다. 성령의 존재론적 문제, 즉 ''필리오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론과 위격의 고유성이 성령의 현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복잡하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자 인간이시기에, 이는 성령의 위격 또는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리스도는 성령에게 하느님 아버지(창조되지 않음)와 인간(창조됨) 모두의 기원 또는 존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니케아 신경에서 최종적으로 정의된 삼위일체의 내재성 하느님이 현실에서 자신을 표현하시는 방식(그의 활동)은 신경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 존재들 간의 상호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니케아 신경 내에서 정의되지 않는다. 하느님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하느님의 존재를 단순한 활동(현실, 활동, 잠재력)으로 축소하여 신경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Meyendorff에 따르면 인격주의의 옹호자들에게 반-사벨리우스주의 이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리의 ''actus purus''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현대 정교회 신학 학문은 윌리엄 라 듀에 따르면, "포티우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엄격한 전통주의"를 고수하는 학자 그룹과 "필리오퀘에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다른 학자들로 나뉜다. "엄격한 전통주의" 진영은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 양쪽에서 이중 유출이라는 개념은 정교회 신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로스키의 입장을 예로 들 수 있다. 로스키에게 이러한 비양립성은 매우 근본적이어서,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성령의 유출 문제는 동서 교회의 분열의 유일한 교리적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불가코프는 필리오퀘가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재결합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이 의견은 Болотов, Василий Васильевич|바실리 볼로토프ru가 공유했다.
필리오퀘를 비난하는 로스키, 스타닐로이에, 로마니데스, 포마잔스키의 견해를 모든 정교회 신학자들이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칼리스토스 웨어는 이것을 정교회 내의 "엄격주의" 입장으로 간주한다. 웨어는 이 문제에 대한 더 "자유로운" 입장은 "피렌체에서 연합 조약을 체결한 그리스인들의 견해였다. 이것은 현재 많은 정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이기도 하다"라고 말한다. 그는 "자유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성령의 유출에 대한 그리스와 라틴의 교리는 모두 신학적으로 옹호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성령이 아들 '을 통하여' 아버지에게서 유출된다고 주장하고, 라틴인들은 성령이 아버지 '와' 아들에게서 유출된다고 주장하지만, 아들과 성령의 관계에 적용될 때, 이 두 전치사 '을 통하여'와 '에서'는 같은 의미이다."라고 썼다. 『기독교 신학 백과사전』은 볼로토프, 파울 에브도키모프, I. 보로노프, S. 불가코프를 필리오퀘를 허용 가능한 신학적 견해 또는 "테올로구메논"으로 보는 사람으로 열거한다. 볼로토프는 테올로구메논을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지 신학자 이상인 사람들, 즉 분열되지 않은 교회의 성인들의 신학적 견해"로 정의했다. 볼로토프는 이 견해들을 높이 평가했지만, 교리들과는 확연히 구분했다.
불가코프는 『위로자』에서 "그것은 조기에, 잘못 교리화된 신학적 견해의 차이이다. 아들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교리는 없으며,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특정한 견해는 이단이 아니라 분열적인 정신이 교회에 자리 잡고 모든 종류의 전례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점을 기꺼이 이용하면서 이단으로 변형된 단순한 교리적 가설일 뿐이다."라고 썼다.
칼 바르트는 동방 정교회에서 우세한 견해가 볼로토프의 견해라고 생각했는데, 볼로토프는 신조가 필리오퀘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 문제가 분열을 초래하지 않았고 동방 정교회와 구 가톨릭 교회 사이의 상호 친교에 절대적인 장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구레츠키는 2009년에 볼로토프의 견해가 정교회 신학자들 사이에서 더욱 널리 퍼지고 있으며, 정교회 신학자 테오도르 스타일리아노풀로스를 인용하여 "아리우스파 종속주의에 대항한 서방에서의 필리오퀘의 신학적 사용은 동방 전통의 신학적 기준에 따라 완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브 콩가르는 1954년에 "대다수의 정교회 신자들은 필리오퀘가 이단이나 교리적 오류가 아니라 허용 가능한 신학적 견해, 즉 '테올로구메논'이라고 말하며, 12세기 주교 니케타스 니코메디아를 인용했다. 19세기 철학자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 그리고 20세기 작가 볼로토프, 플로로프스키, 불가코프를 인용했다.
서방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 즉 정교회에서 말하는 성신은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이자 신이며 사람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를 구성한다.
문제는 정교회에서는 "성신은 아버지로부터 발한다"고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발한다"고 하는 점의 차이이다.
8. 5. 오리엔트 정교회
모든 오리엔트 정교회(콥트, 시리아,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말란카라)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원문을 사용하며,[54] 필리오케 조항이 없다.[55]8. 6. 동방 교회
오늘날 동방 교회에서 파생된 아시리아 동방 교회와 고대 동방 교회는 니케아 신경을 암송할 때 "성자(聖子)를 통하여"라는 구절을 사용하지 않는다.[56]9. 최근의 신학적 관점
현대에 들어서도 필리오퀘 문제는 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78년과 1988년 램버스 회의는 성공회에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필리오퀘''를 생략하도록 권고했다.[42] 1993년, 성공회 수장들과 성공회 자문 위원회의 합동 회의에서는 전례에서 ''필리오퀘'' 조항 없이 신경을 인쇄하라는 요청에 따르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43] 미국 성공회는 1994년 총회에서 공동 기도서 개정 시 ''필리오퀘''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1979년 이후로 개정되지는 않았다.[44] 스코틀랜드 성공회는 현대 언어 전례에서 ''필리오퀘'' 조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티모시 웨어 주교는 이 문제가 근본적인 교리적 차이보다는 의미론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52][57] 영어 예식 위원회는 "'필리오퀘'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삼위일체를 인간사에 드러나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원본 그리스어 텍스트는 신성 내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많은 역사적 분쟁과 마찬가지로, 두 당사자는 동일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58]
1995년, 그리스도교 일치 증진 교황청 평의회(PCPCU)는 그리스어 동사 ἐκπορεύεσθαιgrc와 라틴어 동사 ''procederela'' 사이의 중요한 의미 차이를 지적했다. 두 동사는 모두 "나오다"로 번역되지만, ἐκπορεύεσθαιgrc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주된, 고유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기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라틴어 동사는 προϊέναιgrc에 해당하며 매개체를 통해서도 나아가는 것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성령의 유출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ἐκπορευόμενονgrc ("유출하시는 분")은 아들에 관해서는 그리스어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지만, 아버지에 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68]
요한 지지울라스 대주교는 아버지를 성령의 유일한 근원 및 발원지로 하는 정교회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PCPCU의 발표가 화해의 긍정적인 조짐을 보여준다고 선언했다. 그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유출되는 데 있어 아들의 '매개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고 언급하며, 이 역할은 '...을 통하여'(διάgrc)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표현(εκ Πατρός δι'Υιούgrc)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졌다. 지지울라스는 바티칸의 성명이 "가톨릭과 정교회 간의 현재 신학적 대화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기반"이라고 언급한 점에 동의하며, "'유일한 원인'의 원칙에 비추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68]
1898년 러시아 신학자 보리스 볼로토프는 ''필리오퀘''가 포티우스의 "성부 ''홀로''로부터"와 마찬가지로 재일치 회복에 절대적인 장애가 될 수 없는 허용 가능한 신학적 의견(신학적 논의, 교리가 아님)이라고 주장했다.[59] 볼로토프의 주장은 세르게이 불가코프 등 정교회 신학자들이 지지했지만, 로스키는 거부했다.
테오도르 스틸리아노풀로스는 1986년에 현대 논의에 대한 광범위하고 학술적인 개요를 제시했다. 웨어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문제는 기본적인 교리적 차이보다는 의미론과 강조점의 차이에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홀로 발원한다"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원한다"는 "발원한다"로 번역된 단어가 실제로 다른 의미를 가질 경우 ''모두'' 정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60]
9. 1. 언어적 문제
칼 바르트를 비롯한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은 '필리오퀘' 교리를 옹호한 반면, 성공회와 모라비아 교회 등은 '필리오퀘'를 사용하지 않거나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42][43][44] 미국 성공회는 1994년 총회에서 공동 기도서 개정 시 '필리오퀘'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1979년 이후로 개정되지는 않았다.[44] 스코틀랜드 성공회는 현대 언어 전례에서 '필리오퀘' 조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이러한 논쟁에 대해 티모시 웨어 주교는 이 문제가 근본적인 교리 차이보다는 의미론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52][57] 영어 예식 위원회는 "'필리오퀘'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삼위일체를 인간사에 드러나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원본 그리스어 텍스트는 신성 내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많은 역사적 분쟁과 마찬가지로, 두 당사자는 동일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58]
1995년, 그리스도교 일치 증진 교황청 평의회(PCPCU)는 그리스어 동사 ἐκπορεύεσθαιgrc와 라틴어 동사 procederela 사이의 중요한 의미 차이를 지적했다. 두 동사는 모두 일반적으로 "나오다"로 번역되지만, ἐκπορεύεσθαιgrc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주된, 고유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기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라틴어 동사는 그리스어 동사 προϊέναιgrc에 더 해당하며, 매개체를 통해서도 나아가는 것에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 성령의 유출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ἐκπορευόμενονgrc ("유출하시는 분")은 아들에 관해서는 그리스어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지만, 아버지에 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한 지지울라스 대주교는 아버지를 성령의 유일한 근원 및 발원지로 하는 명확한 정교회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교 일치 증진 교황청 평의회(PCPCU)의 1995년 발표가 화해의 긍정적인 조짐을 보여준다고 선언했다.[52] 그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유출되는 데 있어 아들의 '매개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고 언급하며, 이 역할은 '...을 통하여'(διάgrc)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여 표현(εκ Πατρός δι'Υιούgrc)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졌다. 지지울라스는 바티칸의 성명이 "가톨릭과 정교회 간의 현재 신학적 대화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기반"이라고 언급한 점에 동의하며, "'유일한 원인'의 원칙에 비추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9. 2. 일부 정교회의 필리오케 재고
동방 정교회는 필리오케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공의회적 선언을 한 적은 없다.[45] 그러나 막시무스 참회자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라틴족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포티오스 1세를 포함한 여러 동방 정교회 성인들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필리오케''를 추가하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했다.[45]오흐리드의 테오필라크트 성인 역시 그 차이가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화해를 촉구했다.[47][48][49]
현대 정교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필리오케''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블라디미르 로스키와 같은 학자들은 ''필리오케''가 동방 정교 신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동서 교회 분열의 유일한 교리적 근거라고까지 말한다.[46] 반면, 세르게이 불가코프와 같은 학자들은 ''필리오케''가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재결합에 큰 장애물이 아니라고 보았다.[46]
칼 바르트는 바실리 볼로토프의 견해가 동방 정교회에서 우세하다고 보았는데, 볼로토프는 신조가 필리오퀘를 부인하지 않으며, 그 문제가 분열을 초래하지 않았고 동방 정교회와 구 가톨릭 교회 사이의 상호 친교에 절대적인 장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53]
칼리스토스 웨어는 이 문제가 근본적인 교리적 차이보다는 의미론적인 문제라고 보았다.[52][57]
1995년, 그리스도교 일치 증진 교황청 평의회(PCPCU)는 그리스어 동사 ἐκπορεύεσθαι(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주된 방식으로 기원함을 나타냄)와 라틴어 동사 ''procedere''(매개체를 통해서도 나아가는 것에 적용될 수 있음) 사이의 중요한 의미 차이를 지적했다.[68]
존 지지울라스 대주교는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유출되는 데 있어 아들의 '매개적' 역할을 인정한다고 언급하며, PCPCU의 발표가 화해의 긍정적인 조짐을 보여준다고 선언했다.[68]
최근 일부 정교회 신학자들은 "성부에게서 성자를 통하여" (''ex Patre per Filium'' / ''εκ του Πατρός δια του Υιού'')라는 공식을 제안하기도 했다.[71]
10. 화해를 위한 최근 시도
19세기 후반부터 에큐메니컬 운동이 시작되면서 '필리오퀘' 논쟁을 기독교 연합의 장애물로 여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로스키는 '필리오퀘'가 정교회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으며, 두 교회를 분리하는 핵심 문제라고 주장했다.[79] 반면, 서방 교회들은 '필리오퀘'가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니케아 신경에 삽입된 방식이 에큐메니컬 대화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일부 서방 교회들은 '필리오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신학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신경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타협을 통해 동서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이고 근본적인 선언으로서 신경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회복하고자 했다.
가톨릭 교회, 구 가톨릭 교회, 성공회, 세계 교회 협의회 등 여러 교단에서 필리오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03년, 북미 정교회-가톨릭 신학 협의회는 '필리오퀘: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인가?'라는 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필리오퀘 문제가 더 이상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0. 1. 가톨릭 교회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데메트리오스 1세와 바르톨로메오스 1세와 함께 니케아 신조를 '필리오퀘' 구절 없이 그리스어로 낭송했다.[72]10. 2. 구 가톨릭 교회
1871년 구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직후, 신학자들은 동방 정교회와 접촉을 시작했다. 1874년부터 1875년까지 두 교회의 대표들은 본에서 성공회 및 루터교 신학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연합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필리오퀘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논의했다. 처음부터 구 가톨릭 신학자들은 서방에서 ''필리오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경적인 방식으로 도입되었다는 동방 정교회의 입장에 동의했다. 구 가톨릭은 이 본 회의에서 니케아 신경에서 ''필리오퀘''를 삭제한 최초의 서방 교회가 되었다.[73]10. 3. 성공회
람베스 회의는 1888년, 1978년, 1988년 세 차례에 걸쳐 성공회 소속 교회들에게 니케아 신조에서 '필리오퀘'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74] 1930년 람베스 회의는 성공회와 정교회 대표자들 간의 공식적인 신학적 대화를 시작했고, 1976년 성공회-정교회 공동 교리 위원회는 '필리오퀘'가 공의회의 권한 없이 포함되었으므로 신조에서 생략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1994년 미국 성공회 총회는 다음 판 공동 기도문에서 니케아 신조의 '필리오퀘'를 삭제하기로 결의했다.[75] 최근 로버트 런시, 조지 캐리, 로완 윌리엄스, 저스틴 웰비 등 네 명의 캔터베리 대주교 즉위식에서는 '필리오퀘'를 생략한 니케아 신조를 암송했는데, 이는 "정교회 손님들과 그들의 교류에 대한 우정의 제스처"로 여겨졌다.[76][77]
2017년 10월 말, 성공회와 오리엔트 정교회 신학자들은 성령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이는 2015년에 시작된 논의의 정점이었다. 합의 성명은 필리오퀘 조항의 생략을 확인한다.[78]
10. 4. 세계 교회 협의회 (WCC)
세계 교회 협의회(WCC) 연구 그룹은 1979년에 ''필리오퀘'' 문제를 검토하고 "''필리오퀘''가 없는 신경의 원래 형태를 모든 곳에서 규범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복원하여, 모든 기독교인들이 ... 성령에 대한 공통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1] 그러나 약 10년 후, 세계 교회 협의회는 이 권고를 실행한 회원 교회가 거의 없음을 안타까워했다.[2]10. 5.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신학자들의 공동 성명
2003년 10월, 북미 정교회-가톨릭 신학 협의회는 '필리오퀘: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인가?'라는 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1] 이 성명서는 성경, 역사, 신학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제공하며,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번호 | 내용 |
|---|---|
| 1 | 하나님의 내적 생명에 대해 결정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 2 | 정교회와 가톨릭은 성령의 유출 문제에 대해 상대방의 전통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
| 3 | 정교회와 가톨릭 신학자들은 성령의 신성 및 위격적 정체성(우리 교회의 수용된 교리)과 성령의 기원 방식(아직 완전하고 최종적인 에큐메니칼 해결을 기다리고 있음)을 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 4 | 성령의 기원에 대한 신학적 문제와 교회 내 수위권과 교리적 권위에 대한 교회론적 문제를 가능한 한 구분하고, 동시에 두 질문 모두를 진지하게 함께 추구해야 한다. |
| 5 | 우리 교회 간의 신학적 대화는 일반적으로 에큐메니칼로 받아들여지는 7개 공의회 이후 양 교회에서 열린 후기 공의회의 지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 6 | 가톨릭 교회는 381년 신경의 규범적이고 불가역적인 교리적 가치로 인해, 교리 교육 및 전례 사용을 위해 해당 신경을 번역할 때 원래 그리스어 텍스트만 사용해야 한다. |
| 7 | 가톨릭 교회는 증가하는 신학적 합의, 특히 교황 바오로 6세가 발표한 성명에 따라, 리옹 2차 공의회(1274)에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유출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감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죄한 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한다. |
협의회는 ''필리오퀘'' 문제가 더 이상 완전한 화해와 완전한 친교를 방해할 수 있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작업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결정은 가톨릭 및 정교회 주교들의 몫이다.[1]
11. 요약
19세기 후반부터 ''필리오퀘'' 논쟁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기독교 연합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로스키는 ''필리오퀘''가 정교회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으며, 두 교회를 분리하는 핵심 문제라고 주장한다.[79] 서방 교회들은 ''필리오퀘''가 교리적으로 건전하지만, 니케아 신경에 삽입된 방식이 대화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본다. 따라서 일부 서방 교회들은 핵심 신학적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신경에서 ''필리오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타협은 동서 교회가 신경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리오퀘 교리는 서방에서는 전통적인 것이었으며, 447년 교황 레오 1세에 의해 교리적으로 선언되었다.[28] 이 교리는 아리우스 논쟁의 7세기 스페인의 반 아리우스적인 상황에서 신조에 포함되었지만, 동방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회 정치, 권위 갈등, 민족적 적대감, 언어적 오해, 개인적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동방과 서방의 분열을 초래했다. 라틴어로 표현된 이 문구는 서방 교회에 의해 확정적으로 지지되었으며, 레오 1세에 의해 교리적으로 선언되었고,[28] 리옹과 피렌체의 공의회에서 지지받았다.
이 교리가 이단이라는 것은 현재 모든 정교회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웨어에 따르면, 많은 정교회 신자들은 성령이 성부 ''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성부 ''를 통해''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볼로토프와 그의 제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리오퀘''는 서방의 ''신학적 견해''로 간주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Canon VII
http://www.ccel.org/[...]
[2]
웹사이트
Excursus on the Words πίστιν ἑτέραν
http://www.ccel.org/[...]
[3]
성경
[4]
간행물
Letter to Marinus
[5]
성경
[6]
성경
[7]
성경
[8]
성경
[9]
성경
[10]
성경
[11]
간행물
De Spiritu Sancto
[12]
간행물
De Spiritu Sancto
[13]
간행물
Oratio 39
[14]
성경
[15]
서적
Forty gospel homilies
https://books.google[...]
Cistercian Publications
[16]
서적
Morals on the Book of Job
http://www.lectionar[...]
[17]
서적
Morals on the Book of Job
http://www.lectionar[...]
[18]
성경
[19]
웹사이트
L'Idea di Pentarchia nella Christianità
http://www.homolaicu[...]
[20]
백과사전
Nicene Creed
https://www.britanni[...]
2012-11-09
[21]
성경
[22]
성경
[23]
서적
Jesus Christ, eternal God : heavenly flesh and the metaphysics of matter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4]
웹사이트
Filioque: a response to Eastern Orthodox objections
http://www.catholic-[...]
Catholic Legate
2006-12-12
[25]
서적
The Syriac Church and Fathers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Knowledge, London 1909, reproduced by Gorgias Press
[26]
웹사이트
Cite CCC
[27]
웹사이트
The origin and terminology of the Athanasian Creed
http://hdl.handle.ne[...]
Wisconsin Lutheran Seminary Digital Library
[28]
웹사이트
Cite CCC
[29]
웹사이트
Cite CCC
[30]
웹사이트
Franks, Romans, feudalism, and doctrine
http://www.romanity.[...]
[31]
서적
The reign of Leo VI (886–912): politics and people
https://books.google[...]
Brill
[32]
서적
Churches of Eastern Christendom – From A.D. 451 to the Present Time
https://books.google[...]
Routledge
[33]
서적
Συνοδική Επιτροπή για τη θεία Λατρεία
[34]
서적
For the Unity of All: Contributions to the Theological Dialogue between East and West
https://books.googl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5
[35]
서적
The Oxford History of Byzantium
Oxford University Press
[36]
서적
CRISIS IN BYZANTIUM The Filioque Controversy in the Patriarchate of Gregory II of Cyprus (1283-1289)
Fordham University Press
[37]
간행물
The Synod of Jerusalem and the Confession of Dositheus, A.D. 1672
https://www.ccel.org[...]
1876
[38]
서적
The multivalence of biblical texts and theological meanings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39]
서적
Lectures in Christian Dogmatics
https://books.googl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09-02-28
[40]
웹사이트
Article 1 of the Treaty of Brest
http://www.ewtn.com/[...]
Ewtn.com
2013-04-25
[41]
웹사이트
Dominus Iesus
https://www.vatican.[...]
2000-08-06
[42]
웹사이트
The Nicene Creed – texts
http://www.churchsoc[...]
[43]
웹사이트
General Convention Sets Course For Church 19 September 1985
http://www.episcopal[...]
Episcopalarchives.org
1985-09-19
[44]
웹사이트
Resolution 1994-A028, "Reaffirm Intention to Remove the Filioque Clause From the Next Prayer Book."
http://www.episcopal[...]
Episcopalarchives.org
[45]
문서
Sunday of the Nicene Fathers 2016
https://stelias-lacr[...]
[46]
서적
Orthodoxy and the West: Hellenic self-identity in the modern age
Holy Cross Orthodox Press
2006-01
[47]
문서
Byzantine Theology: Historical Trends & Doctrinal Themes
Fordham U
[48]
문서
A Discourse by Theophylact of Bulgaria to One of His Disciples Regarding the Charges Against the Latins
https://philosophiaj[...]
[49]
웹사이트
Saint Theophylact of Ochrid
https://www.johnsani[...]
[50]
웹사이트
Life after death
http://www.pelagia.o[...]
[51]
웹사이트
Eccumenical Council of Florence and Council of Basel
http://www.ewtn.com/[...]
Ewtn.com
2013-04-25
[52]
웹사이트
A Lutheran-Orthodox Common Statement on Faith in the Holy Trinity
http://download.elca[...]
Chaldean Catholic Diocese of St. Peter the Apostle
1998-11-04
[53]
서적
Church Dogmatics
https://books.google[...]
Bloomsbury Academic
2004-05-08
[54]
웹사이트
Geevarghese Mar Yulios: Ecumenical Council of Nicea and Nicene Creed
http://mosc.in/the_c[...]
[55]
웹사이트
Paulos Mar Gregorios: Oriental and Eastern Orthodox churches
http://mosc.in/the_c[...]
[56]
웹사이트
Q & A on the Reformed Chaldean Mass
http://kaldu.org/201[...]
Chaldean Catholic Diocese of St. Peter the Apostle
2015-07-13
[57]
서적
A voice from the Byzantine East
Educational Services, [Melkite] Diocese of Newton
[58]
웹사이트
Praying together
http://www.englishte[...]
English Language Liturgical Consultation
2007-05
[59]
서적
Aspects of church history
Nordland
[60]
웹사이트
The Father as the source of the whole Trinity
http://www.geocities[...]
1995-05
[61]
서적
History of Russian philosoph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62]
웹사이트
The Filioque in the Dublin Agreed Statement 1984
http://www.romanity.[...]
1987-09-14
[63]
문서
St Basil Liturgy
http://www.copticchu[...]
[64]
웹사이트
The faith that was formulated at Nicaea
http://www.eotc.fait[...]
Eotc.faithweb.com
1994-12-25
[65]
웹사이트
The Nicene Creed
http://malankaraorth[...]
Malankaraorthodoxchurch.in
[66]
웹사이트
The Nicene Creed
http://sor.cua.edu/L[...]
Sor.cua.edu
1997-06-08
[67]
학술회의
Missed opportunity: the Council of Ferrara-Florence and the use of Maximus the Confessor's theology of the filioque
http://www.bsana.net[...]
Byzantine Studies Conference
[68]
논문
Reflections on the Filioque
https://www.questia.[...]
Temple University
1997-03
[69]
서적
Catholicism
https://archive.org/[...]
HarperSanFrancisco
[70]
서적
Teaching with authority: a theology of the magisterium in the church
https://books.google[...]
Liturgical Press
[71]
서적
Scripture in tradition: the Bible and its interpretation in the Orthodox Church
https://books.google[...]
St Vladimir's Seminary Press
[72]
웹사이트
Presentation of the celebration [of the Solemnity of Saints Peter and Paul]
https://www.vatican.[...]
2004-06-29
[73]
서적
Introduction to theology
https://books.google[...]
Church Publishing, Inc.
2011-12-22
[74]
서적
Eucharistic Sacramentality in an Ecumenical Context: The Anglican Epiclesis
https://books.google[...]
Ashgate Publishing, Ltd.
[75]
백과사전
Filioque
http://archive.episc[...]
Church Publishing
2015-11-12
[76]
서적
Historical dictionary of Anglicanism
https://books.google[...]
Scarecrow Press
[77]
웹사이트
The Inauguration Of The ministry Of The One Hundred And Fifth Archbishop Of Canterbury Justin Portal Welby
https://www.anglican[...]
2024-01-09
[78]
웹사이트
Historic Anglican – Oriental Orthodox agreement on the Holy Spirit signed in Dublin
http://www.anglicann[...]
2017-11-02
[79]
서적
Enriching our worship: supplemental liturgical materials
https://books.google[...]
Church Publishing
[80]
서적
The masterpieces of Catholic literature, oratory and art ...
[81]
서적
Amazing grace: 366 inspiring hymn stories for daily devotions
https://archive.org/[...]
Kregel
[82]
서적
Source and summit: commemorating Josef A. Jungman, S.J.
Liturgical Press
[83]
문서
코이네 그리스어 발음을 따름.
[84]
문서
교회라틴어 발음을 따름
[85]
서적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
분도출판사
[86]
문서
역사적으로 로마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하에 설립되었으며, 베드로는 로마교회에서 활동했던 적이 없으며, 단지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했을 뿐이었다.
[87]
서적
교회론의 변천사
기독교서회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